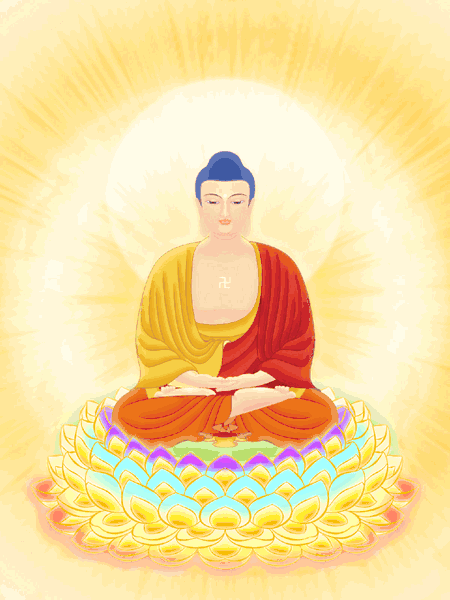어린아이의 마음은 수행자를 닮았다 불전에서는 생 명체가 살아가는 윤회의 현장으로 욕계, 색계, 무색계의 삼계를 말한다. 이 가운데 욕계나 무색계가 무엇인지 짐작하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다 욕계는 남녀나 암수와 같은 성(Sex)이 있는 곳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나 짐승,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(性)을 갖는 천신인 육욕천(六欲天)이나 아귀, 지옥중생이 사는 곳이다. 무색계의 경우 육체와 같은 물질〔色〕이 없기에〔無〕공간적 위치를 갖지않는다 요가 수행자 개개인이 체득하는 '삼매의 경지'로 그 깊이에 따라서 공무변처(空無邊處), 식무변처(識無邊處), 무소유처(無所有處), 비상비비상처(非想非非想處)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. 공무변처란 '객관대상인 허공'이 무한히 펼쳐진 삼매이고, 식무변처는 '주관인 인식'..